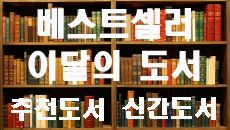[연속 기획보도/ 교육] 1. 교육의 제로섬(Zero-Sum) 제로섬이란 변동량의 총합이 원상태라는 말이다. 어떠한 시장의 점유율은 누군가 얻은 만큼 누군가는 잃는다. 함께 동시에 오를 방법은 없다. 교육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발전사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최근 10년 전후만 보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 교육의 성장기에서는 사교육의 역할이 보편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은 정점에 달해 있기에 성장은 거의 불가하다. 오히려 공교육 보호정책으로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 캠프나 체험학습을 연계하면서 사교육시장이 학교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학교의 교사수와 학생수 조사에 의하면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교사수는 계속 증가한다. 초과 공급이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어 반 강제 희망퇴직을 권고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금 준비가 안 되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교육은 교육과 제도, 행정과 실무에서 충분히 믿을 만 하다고 평가하는 오류를 실감하는 사례이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계에는 자원의 고갈이다. 물리적 자원이라면 수입에 의존할 수 있으나, 학생은 원천적이고 범국가적 투자자원이란 점에서 현저히 다르다. 소비로 이루어지기 까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란 시간 격차가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선거는 5회, 대통령선거는 4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딜레마이다. 교육정책이 교육과학부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과 국가 정책에 좌우되는 요인이 크다. 그러한 환경이 사교육에는 얼마나 매섭게 적용되겠는가? 스포츠의 정신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지향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만큼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운운할 수 없다.
매번 바뀌는 입시정책은 공부라는 실체의 기준을 잡아 흔드는 행위이다. 운동장 학생들에게 체벌이 아닌 불편을 강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속적으로 기준을 바꿔가며 재정렬 시키는 것이다. 이러하듯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에 대한 미션과 비전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교육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대한 공교육은 변화지체가 불가피한 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교육 시장은 빠르게 대응하고 체질까지 개선한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선택할 뿐이다. 나아가 공교육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교육은 선구자였고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틀과 방향을 늘 제시해 왔다.
기술학원을 기술학교에 접목시켰고, 원어민 영어와 예체능을 방과 후 수업에 정착시켰으며, 지금은 현장체험학습까지 학교의 전유물처럼 앗아 갈 정도로 충분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 사이 애써 개척하고 개발하고 투자해서 상용화 시킨 대가로 학원인은 죄인처럼 강제당하고 교습비 제한까지 겪어야 했다.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 건설 덕분에 전국적으로 학생수 감소 속에서도 2010년 까지는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늦게 환경변화를 실감했고 대비에 늦었다는 것이다. 학원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학교는 교실정원 축소, 잉여교실에 대한 용도개선 및 방과 후 교실, 그에 따른 교사의 배분정책으로 자구책 마련이 용이하다.
학원은 고작 소수과외식 수업으로의 전환 뿐 내세울 대안이 없이 비용증가와 소득축소로 이어져 이미 많은 학원이 청산절차를 마쳤고, 그런 중에도 무서운 속도로 학원 창업이 빈번하다.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다.
극한에서 살아남는 법은 힘이 세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파이가 줄어드는 교육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맞서면 어려울 것이다. 적응하고 편승하거나 슬림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대안은 오픈소스와 리소스 쉐어링이 아닐까 싶다. 다양한 학원과 강사를 모아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능과 역량을 재정비하고 융합하여 블루오션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제로섬을 타개할 혁신이 필요하다.
최성민 연세학원장 자문
|